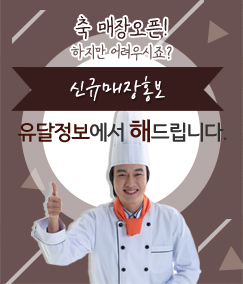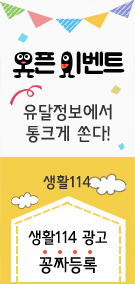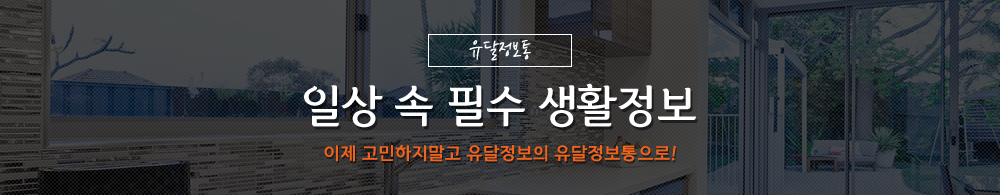|
|
 |
| |
|
돌이 많이 흩어져 있고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여 암태도로 유래되었으며, 약 600년 전 최씨가 처음으로 입도하여 살았다고 한다. 암태도의 쌀은 일찌기 간척지 특유의 우수한 미질로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이러한 토지와 더불어 암태도는 선인들의 피와 땀, 눈물과 통곡이 스며있는 역사와 무게를 짊어진 고장이기도 하다.
| | |
| | | |
| |
 |
 |
익금우실 | |
| |
|
1830년경 우씨가 배를 타고와서 마을을 위하여 지금의 익금, 신석 일대를 돌아보고 방풍 및 방파제로서 사대문을 건립하기 위해 농치를 동문, 생김을 서문, 오루골을 남문, 익금을 북문이라 하였다.
현재는 북문인 익금 우실만이 남아 있다. | | |
| |
 |
| |
 |
 |
송곡우실 | |
| |
|
송곡마을 어귀에 길다란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은 1905년 지나가던 스님이 마을 번창과 우환을 막으려면 이 곳에 담을 쌓아야 한다고 하여 돌을 이용 우실을 만들었다. | | |
| |
 |
| |
 |
 |
노만사 | |
| |
|
송곡마을 어귀에 길다란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은 1905년 지나가던 스님이 마을 번창과 우환을 막으려면 이 곳에 담을 쌓아야 한다고 하여 돌을 이용 우실을 만들었다. | | |
| |
 |
| |
 |
 |
매향비 | |
| |
|
매향은 향을 묻는 신앙의례이다.
말단 향촌사회를 단위로 해서 구현되며 특히 발원자 들이 공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적 위기감에서 시작된 순수한 민간신앙이다. 1405년 건립된 매향비는 암태면 장고리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비석거리'에 위치한다.
매향비는 정제되지 않은 자연석의 평평한 면에 음각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 되었는데 비문의 내용은 제1행에 매향처반사도라 하여 매향의 위치와 방위가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비문의 내용은 매향처 사방기준기 매향시기 주도집단 매향과 비석을 세운 경위 참여자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매향비의 특징은 매향의 주도층으로 '향도'가 명시된 점과 '매향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 | |
| |
 |
| |
 |
 |
소작인항쟁기념탑 | |
| |
|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0년대에 대표적 소작쟁의로 1923년 8월~1924년 8월까지 전개되었다. 서태석의 주도로 소작인들은 '암태소작회'를 결성, 7~8할의 고율소작료를 4할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주가 묵살하자 소작료 불납동맹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소작회는 지주측 부친의 송덕비를 무너뜨리고 충돌하여 간부 13명이 검거 되었다.
이에 박복영과 농민 400여명이 목포경찰서와 재판소에서 집단농성을 벌여 사회문제화 되자 일제 관헌이 개입하여 '소작료 4할로 인하, 구속자 쌍방 고소취하, 비석은 소작회 부담으로 복구한다'는 약정서가 교환되었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서해안 섬들과 전국적인 소작쟁의가 계기가 되었으며, 지주와 그를 비호하는 일제 관헌에 대항한 항일운동이었다. 이에 ྞ년 5월에 조성면적 95평에 높이 6.74m의 기념탑을 건립하여 암태도의 숭고한 소작인 항쟁을 기념하고 있다. | | |
| |
 |
| |
 |
 |
추포노도비 및 노도비 | |
| |
|
수곡리와 추포리를 잇는 노두는 여느 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명물인데, 썰물 때면 2.5km에 이르는 두 마을을 연결해 주는 이 징검다리는 추포리 주민들에게 오래 전부터 전천후 바닷길 구실을 해왔다.
그래서 주민들은 미끄럼을 막기위해 수 천개가 넘는 돌맹이를 매년 한번씩 뒤집어 준다. 이 노두를 건너 추포리로 가면 추포해수욕장이 있으며, 지금은 노두 옆으로 시멘트 포장도로(2000.6.30일 개통)를 개설하여 차를 타고 노두를 감상할 수 있다. | | |
| |
 |
| |
 |
 |
추포해수욕장 | |
| |
|
이 섬은 원래 추엽도와 포도의 두 섬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간척공사로 인해 하나의 섬이 되었다. 추엽도는 울창한 나무사이로 호랑이의 등처럼 보이다가 가을이면 호랑이의 형태를 보인다 하여 추엽도라 하고 포도는 서해바다에 밀려오는 파도가 섬에 닿으면 잔잔해진다 하여 포도라 불렸는데, 추엽도와 포도를 연도한 후부터 추포도라는 지명으로 불러왔다. | | |
| |
 |
| |
 |
 |
남강수사휼은선정비 | |
| |
|
1799년(정조23년) 204년전 비석으로 조선시대 나주제도를 알수 있는 유일한 비이며 섬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의 유일한 기록물이다.
1799년(正租 23)에 나주제도민(羅州諸島民)의 이름으로 건립된 이 비(碑)는 당시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김처한(金處漢)의 휼은공덕(恤隱功德)을 기린 것으로, 전면(前面)에는「수사김공처한휼은선정비(水使金公處漢恤隱善政碑)」라는 비명(碑銘)과 사연송시(四聯頌詩)가 좌우에 새겨져 있고, 비후면(碑後面)에 휼은내용(恤隱內容)이 총 9행 260자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1755년(英祖 31) 이후 건비(建碑) 당시까지의 민막 내용과 그 제역(除役)의 사실이 나타나 있다. |
출처 : 남도코리아
| |